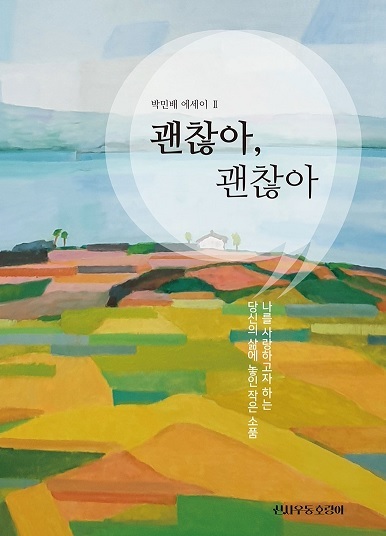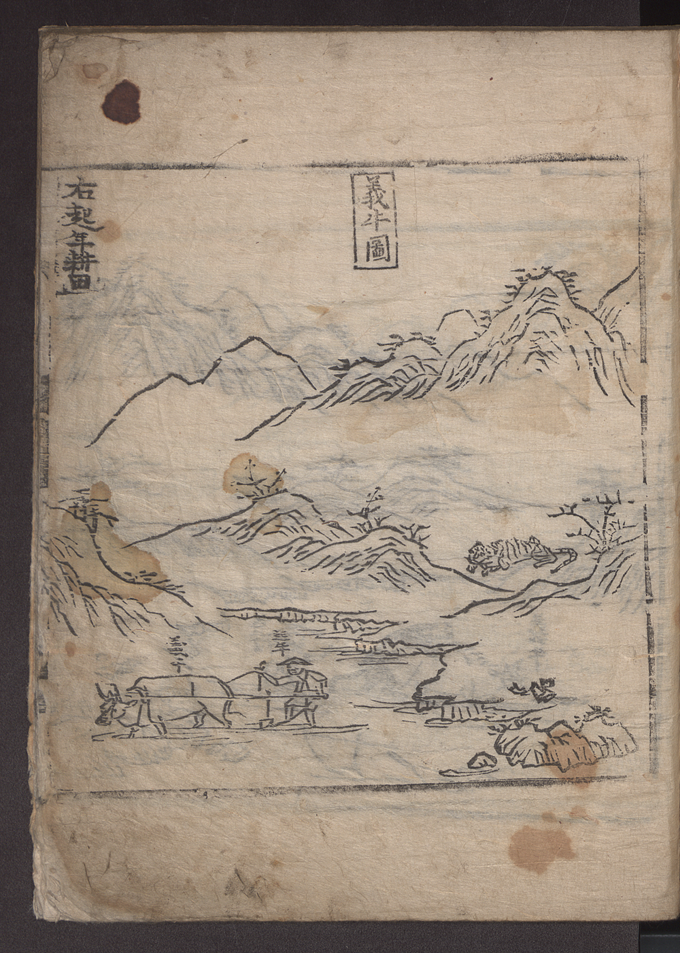‘대한민보’ 1910년 4월10일자에 ‘배우창곡도’라는 한국 최초의 시사만화가 실렸다. 국권이 위태로웠던 당시 이도영이 그린 이 시사만화는 국권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원을 보여준다. 갓 쓰고 두루마기 입은 소리꾼이 합죽선을 들고 고수와 장단을 맞추면서 판소리 한 소절을 내지르는 것을 창밖에 서 있는 이들이 듣고 있는 그림이다. 판소리 ‘사랑가’의 대사에 나오는 뻐꾸기 소리의 ‘뻐꾹, 뻐꾹…’을 ‘복국(復國·나라를 되찾자), 복국…’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내용이다.
이 날카로운 정치풍자화는 당시 신문 구독자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이미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다.
개화기가 되면서 서양의 ‘미술’이란 낯선 개념이 들어오고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수용되기 시작했다. 대략 1890년대에서 1910년대에 걸쳐 이런 현상은 빠르게 진행됐다. 인쇄 매체에 각종 그림을 넣는 것이 당시 새로운 미술의 하나로 인식됐다. 개화기에 등장한 신문 삽화나 만화는 대중들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삽화 형식의 만화는 글을 알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신문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그림의 성격을 인식하게 했다. 당시 ‘대한민보’의 시사만화가 다룬 주제와 내용은 주로 친일파 고발·규탄, 항일 구국정신 고취·계몽, 망국적 사회현상 고발 등이었다. 시사만화를 통해 날카로운 정치 비평을 한 셈이다.
2022년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아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작으로 공개됐다고 한다. 당시 예술고등학교 학생이 그린 이 만화는 수상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 승인 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 명칭 승인을 취소하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국비 보조금도 큰 폭으로 삭감했다.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문화예술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만화의 속성은 ‘풍자와 재미’라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 있고, 국민적 이슈가 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데다 권좌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광복 이후 미술이 극심한 억압을 받아 사회적 발언에 나서지 못한 때는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 시기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술을 통한 현실 참여를 예술적 태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온시하면서 정치적 미술을 문제시한다. 이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참여가 정치적 비판 또는 이념 문제이기에 앞서, ‘작가적 삶과 예술창작 욕구에 잠재된 예술가의 기본 정서’임을 망각한 것이다.
정치적 미술이란 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적 현실에 개입하는 미술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예술은 결국 사회의 반영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시각 이미지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작가의 의도가 작품 주제에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매우 정치적이다. 그러니 정치와 미술을 마치 별개의 것처럼 분리하거나 미술이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일을 불온시하는 것 자체가 무척 이상한 일이다. 우리 삶이 결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듯이, 미술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