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난 최근 10년을 돌아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다. 2016년 알파고는 바둑계를 뒤흔들며 AI의 가능성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이후 챗GPT는 언어 모델의 혁신을 이끌며 인간과의 소통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최근 중국의 AI 챗봇인 딥시크(Deep Seek)는 탐색과 추론 능력을 결합해 AI의 지평을 더 확장하고 있다. AI는 지능·창의성·탐색능력이라는 세 개의 큰 물결로 작용하며, 기술 발전의 삼각파고를 만들고 있다.
과학기술 현장에서 40년가량 일하며 여러 도전과 위협, 발전과 성취를 목격했다. 그런데 딥시크가 보여주고 있는 혁신은 그 무엇보다 위협적이다. 1985년생인 량원펑(梁文鋒) 딥시크 최고경영자(CEO)는 경력 중심의 전통적 인재관 대신 “경험보다 열정과 능력을 갖춘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경영 철학을 실천했다. 창업 이후 6년 동안 실적을 내지 못했지만, 자신과 팀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겼다.
AI 기술의 근본적인 문제 연구
실패 두려워 않고 실험과 도전
정부는 이공계 인재 발굴·육성

그의 팀은 AI 기술의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러한 경영 철학에다 실패를 자산화하는 과정을 통해 딥시크는 독자적인 기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됐고, 놀라운 AI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었다.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한 중국은 여전히 이공계 인재를 최대한 육성하고 지원한다. 이들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도록 독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공계 인재를 주축으로 바이두·알리바바 등 세계적 기업을 길러냈다. 최근엔 추격형을 넘어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당당히 선도 그룹으로 도약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이공계 인재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면, 한국은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심각한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웠던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은 가뜩이나 의학 분야에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이공계 우수 인재 유치의 어려움을 가중했다.
경력 중심의 채용도 문제이지만, 추격형 연구에서 성공 공식을 고집하는 연구조직 문화도 연구자의 창의적 역량 발휘를 저해한다. 한국도 기술 트렌드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와 혁신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첫째, 창의적인 도전을 제안하는 연구자들에게 과감하게 프로젝트를 맡기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와 기업을 긴밀히 연계해 연구자들이 산업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창의적 도전을 활성화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정부도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인 도전에 나선 연구자를 위해 ‘뒤끝 없는’ 과감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딥시크 량원펑 사례처럼 단기적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 실패까지도 자산화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를 확대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체계와 연구 수행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하향식 관리보다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제도와 문화를 갖춘 연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연구할 수 있게 여분의 ‘20% 시간’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면 좋겠다. 직급과 관계없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국내 연구진들의 국제 콘퍼런스 참가와 해외 연수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 국내 연구자들이 ‘월드 클래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직면한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는 미래세대의 심장을 뛰게 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도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며, 장기적 안목의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한국도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우리만의 독특한 혁신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진 전 원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위원


![[Who바이오] 삼성의 해결사 '바이오'…이재용의 해결사 '존 림'](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782262_1462805_m_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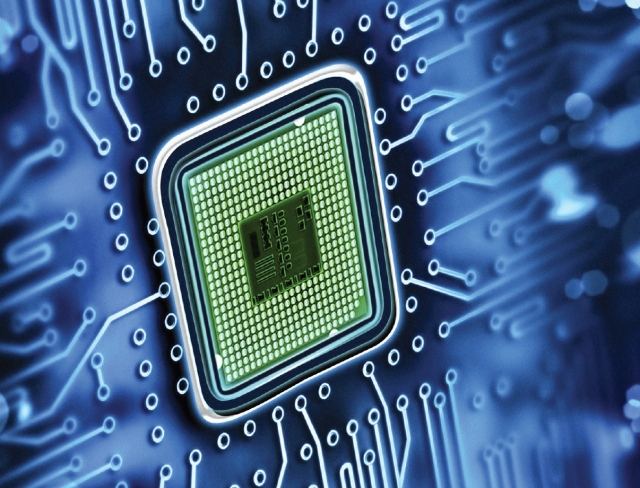


![[청론직설] “반도체 R&D 주52시간은 난센스, ‘예외 적용’ 특별법 조속 입법을”](https://newsimg.sedaily.com/2025/02/17/2GP07UK9M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