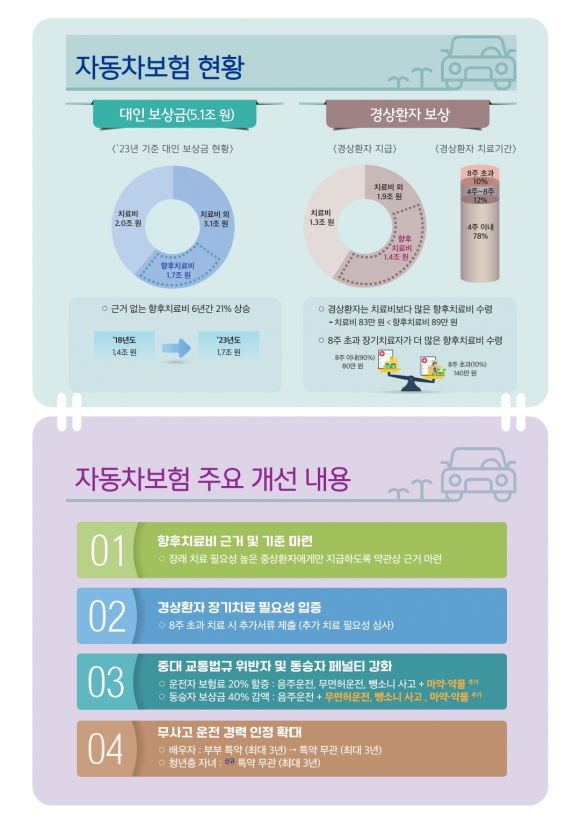『김형성의 保수다』 우리는 왜 공공의료를 외치는가?

국내 유일의 외상센터 수련기관인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유는 정부가 올해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주예산을 깎으면서, 수련센터에 매년 9억 원씩 지급되던 외상 수련센터 사업운영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돼 온 수련센터는 교통사고, 총상, 추락사고 등 치명적이고 복합적인 중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삭감되면서 전문의 2명이 수련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민영화의 개념이 낯설지 않은 건, 이미 한국사회에서 의료란 고도로 상업화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나누고, 국민 중에 민간 암보험, 실손보험 등을 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고, 동네 병원에만 가도 ‘실손보험 여부’를 묻고 그 유무에 따라 진료내용이 달라진다. 이런 문답과 풍경이 익숙한 것이다.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은 낯설다. 다행히 코로나19 펜데믹 때 공공병원만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병원’으로서의 존재의의를 드러냈지만.
수익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예외도 있는 법이다. 예를 들면, 지난 19일 정부는 지방 민간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를 1조원의 세금을 들여 사들인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다. 중증외상 수련센터는 수익성이 없어서 9억 원도 줄 수 없지만 말이다.
의료재난은 이제야 벌어진 일이 아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2천명 의대증원과 이에 반발한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보다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다.
그렇다면 이토록 문제적인 한국의 의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갈 사회에서의 의료는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
이번 『김형성의 保수다』에서는 우리가 왜 공공의료를 외치는지 그 이류를 다시 짚어본다. 영상은 링크(https://youtu.be/Dra9RY3C1LE)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