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프랑스혁명 이야기 2편 - 질풍노도
18세기 ‘계몽사상’, 프랑스혁명의 기본 토양이자 이념 마련
98%의 평민들, 무능한 왕실에 저항해 ‘삼부회’ 소집 앞장
테니스코트 서약 후 바스티유 습격하며 혁명 신호탄 쏘아
프랑스어 ‘뤼미에르’(Lumière)는 ‘빛’을 뜻한다. 여기에 복수형 ‘s’가 붙으면 ‘계몽주의’를 의미한다.
‘어둠에 빛을 비춰 밝고 현명하게 깨우친다’라는 18세기 계몽사상은 프랑스혁명의 기본 토양이자 이념으로 작용했다.
선조 이래 수탈만 당하며 살아온 무지렁이 백성들에게 “그건 팔자 때문이 아니다. 귀족이나 당신이나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당신들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라고 일깨운 것이다.
철학자이자 교육자였던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에밀’과 ‘사회계약론’ 등의 계몽사상 서적을 발표한 것 때문에 해외 도피 등 불행한 말년을 살다 죽었지만, 10년 후 혁명 정부는 그의 시신을 모셔다 만신전(萬神殿)인 판테온(Pantheon) 지하 묘지에 안치시켰다. 판테온 건물 입구에는 ‘위대한 선조들께 조국은 감사를 표한다’(Aux grands hommes, la patrie reconnaissante)라는 문구를 새겼다.
이런 계몽사상과 함께 평민들 의식 수준은 점차 깨어가는데, 고갈되는 국가 재정의 피해는 2% 특권층과는 무관하게 고스란히 98% 평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프랑스 민심은 들끓고 그 원성과 분노는 점차 임계치를 향하는 중이었다. 더욱이 수년간 이어지는 가뭄과 흉작에 홍수와 강추위까지 겹치며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식량 상황은 이미 위기 국면이었다.
이에 왕실 정부는 제1 신분인 성직자와 제2 신분인 귀족들의 대표 기구인 명사회(名士會)를 소집했다. 면세 특권층인 그들에게도 징수를 하겠다는 세제 개혁안을 승인받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그들은 개혁안을 결사반대했다. 자신들의 면세 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왕실은 이러한 특권층의 저항을 제압할 힘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이번엔 제3 신분인 평민 대표들까지 참여하는 ‘삼부회’(三部會)를 소집했다. 175년 만의 일이다. 역시 증세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적인 자리였다.

3개 신분별로 성직자 290명, 귀족 270명, 평민 585명이 참석한 삼부회는, 그러나 평민 대표들이 주장하는 머릿수 표결 방식 채택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은 결론 없이 파행으로 끝이 난다.
평민 대표들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미 의식이 트여 부르주아 계급으로 성장해 있던 그들이었다.
국민의 98%를 대표하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세금도 징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그들은 별도 입법기구인 ‘국민의회’를 결성한다.
평민 대표들의 전례 없는 도발에 놀란 루이 16세는 '국민의회'의 해산을 명령하며 회의장을 폐쇄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는다. 인근 ‘테니스 코트’로 이동해 왕명을 공식적으로 거역한다는 서약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급기야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는 지각 있는 특권층 인사들까지 수십 명 포함하는 ‘국민제헌의회’(Assemblée nationale constituante)로 확대 재편해 국가 최고 입법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춘다.
이때 재정장관 네케르가 갑자기 해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귀족이지만 그동안 평민 편을 들어줬던 장관이다. 시민들은 격분했다. 마침 일요일 아침이었다.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튀를리궁 주변 등으로 모여들어 울분을 토하며 시위대로 돌변했다. 무자비한 진압 작전이 있을 것이고 군대가 총결집 중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다. 시위대 분위기가 급속도로 격해졌다. 시민군을 만들어 결사 항전하자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뤘다. 무장을 위해선 다량의 무기가 필요했다. 1000여 명의 시위대가 질풍노도가 돼 인근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했다.
1789년 7월 14일의 바스티유 습격 사건은 프랑스혁명 촉발의 신호탄이 됐다.
절대왕정을 감싸던 거대한 둑에 균열이 생기자 견고했던 구체제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은 봇물 터지듯 무너져 내렸다.
제헌의회는 속전속결로 봉건제 폐지와 인권 선언을 채택했으나 국왕은 재가를 거부했다. 놀란 귀족들은 서둘러 해외로 도피해 나갔다.
시장통 여인들이 전면에 나선 수천 명의 시위대가 “빵을 달라.”고 외치며 베르사유 궁전까지 20㎞ 행진길에 나섰다.

여인들의 행진 소식을 들은 왕비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텐데….”라고 망언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래저래 파리 시민의 증오 대상이 됐다.
궁전 앞까지 몰려든 7000여 시위대에 놀란 루이 16세는 결국 봉건제 폐지와 인권선언 법안을 재가해야 했다.
게다가 시위대는 국왕의 거주지도 파리 중심가인 튀를리 궁전으로 옮겨버렸다.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 이래 루이 16세까지 왕실의 거처였지만 도심에서 20㎞ 외곽이라 시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바렌 사건이 발생했다.
거의 구금 상태에서 공포에 질려 있던 루이 16세 부부와 가족들이 파리를 탈출해 오스트리아로 도주하다가 국경 인근 바렌에서 붙잡힌 것이다. 이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줬다. 오스트리아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의 친정이긴 했지만, 프랑스와는 엄연한 적국이었기 때문이다.
루이 16세와 왕비에게 반혁명 음모와 적국과의 내통이란 죄목이 씌어졌다. 본인들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적 말로가 노정되기 시작했다.

(3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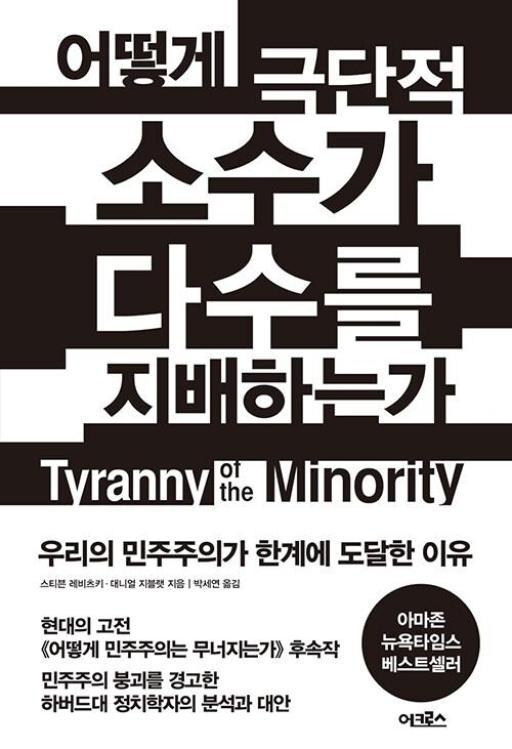
![[김봉섭의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8/art_17400107253012_811a87.jpg)
![[금요칼럼] 그건 교양이 아니에요](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2/20/.cache/512/20250220580301.jpg)
![김병욱 전 의원 “기업과 경제 성장, 이념 넘어선 필수과제” [시경EPA]](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502/108473_128664_5743.jpg)


![[문화산책] 노인과 어른, 발효와 부패](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21/f0a19aa0-ef34-4668-9d43-39719de3566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