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협회, 52년 만에 법정 단체로 승격
현장 역량, 공급 가능성 우선해야

올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만성질환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생활의 제약을 받는 고령층은 여전히 많다. 특히 지방과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동시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 방문 진료, 재택·통합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환자 곁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 구성에 따라 정책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예컨대 의원급 의료기관만 봐도 간호 인력의 80% 이상이 간호조무사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 현장에서도 이 비율은 비슷하거나 더 높다.
그런데도 일부 시범사업이나 제도에는 간호조무사가 공식 서비스 제공 인력에서 제외되곤 한다. 이는 특정 직종의 이해를 넘어 현장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 설계의 오류다. 실제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이들을 배제한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부족해져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간호조무사는 경력과 전문 교육을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역량을 발휘해 왔다.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방문 간호, 치매 관리, 장기요양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도 다수다. 이들을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용 효율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지난 6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2년 만에 법정 단체로 승격됐다. 이는 단순한 지위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간호조무사의 제도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법정 단체는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닌, 국민 건강권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공식 창구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병원 중심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 안에서 예방·관리·돌봄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간호인력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인력 정책은 특정 자격의 선호보다 현장에서 발휘되는 실질적인 역량과 공급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 정책은 현장을 따라가야 하고, 현장은 국민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초고령사회 지역 돌봄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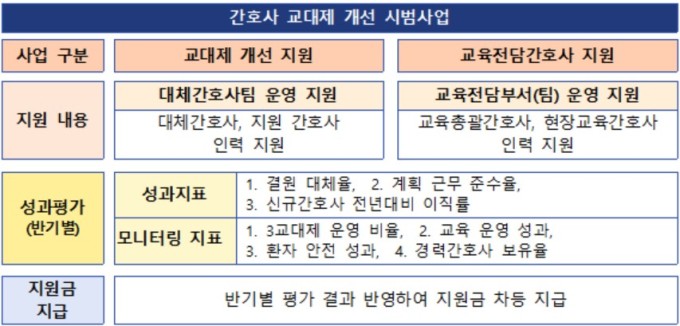


![소아 근시는 성장하면서 자연 회복?… No, 방치하다간 ‘실명’ 부르는 망막박리 위험 88배까지 증가 [부모 백과사전]](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31/202508315097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