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정책금리를 0.1%포인트 올리면 한국의 성장률을 최대 0.08%포인트 깎아 먹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글로벌 전망모형(BOK-GPM) 재구축 결과’에 따르면 한은은 2014년 개발해 운용중인 BOK-GPM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최신 해외 연구동향을 반영해 재구축했다.
이번 모형은 추정기간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3년까지로 연장하고, 신흥아시아 경제를 추가하여 기존의 다국가모형을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한은은 “이번에 재구축한 BOK-GPM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외적 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주요 경제변수에 대한 높은 설명력과 양호한 예측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모형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하는 경우 5분기 시차를 두고 한국의 GDP갭(실질GDP-잠재GDP)이 최대 0.0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결과는 종전 모형에서 추정된 결과 대비 2배가량 큰 반응으로, 미 통화정책에 따른 한국의 경기 하강 우려가 더 커졌다는 얘기다.
한은은 이러한 차이를 보인데에 “미국 정책금리가 인상될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는 영향과 미 기업의 신용스프레드가 상승하면서 여타국의 금융여건도 동반 악화되어 수입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이 보다 정교하게 포착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수요충격에 대한 반응은 한국이 주변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중국 GDP갭 1%포인트 상승 충격 발생 후 4분기 평균을 한 한국의 GDP갭 반응은 1%포인트로 추정됐다.이는 0.02%포인트를 조금 상회한 일본, 신흥아시아보다 월등히 높다. 한은은 이를 두고 “쉽게 말해 충격 발생 후 1년 동안 한 국가들의 성장률에 근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부였했다.
아울러 미국 GDP갭 1%포인트 발생이 끼치는 동 영향 역시 한국이 0.10%포인트로 중국(0.02%포인트), 일본(0.04%포인트)를 훨씬 앞질렀다.
한은은 “향후 미·중 무역분쟁 심화 또는 양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잠재적 영향에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원화 매력없다" 뉴 노멀 된 '환율 1400원 시대'…바닥 찍은 메모리 '낸드값 또 10% 상승'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5KLFX1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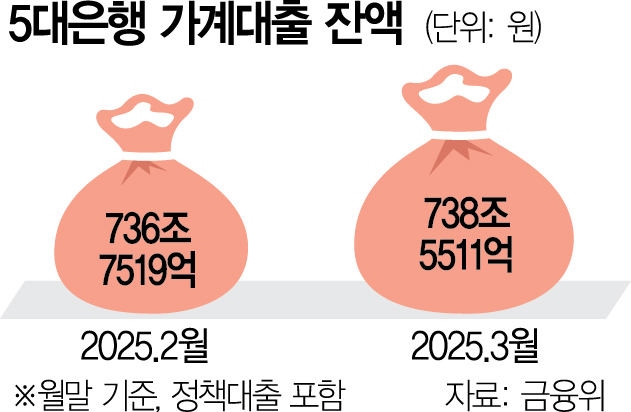


![[목요일아침에] 다 함께 이기는 길](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7JBZ8X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