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챗GPT를 필두로 생성형 AI가 순식간에 일상을 바꿔놨다. 프로그래밍은 물론 법률·광고·여행에 이르기까지 AI가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 없다. 기능 면에서 사람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향후 5년 이내에 AI로 인해 은행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일자리 전망에 대해선 견해가 다소 엇갈린다.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AI와 로봇이 본격 결합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발전으로 노동시장에 큰 충격
일본, 노사 참여로 파격적 개혁
한국도 절박한 노동의제 풀어야

반면, 세계경제포럼(WEF)은 ‘미래 일자리 보고서 2025’에서 AI의 보편화로 2030년까지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1억7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고 낙관했다. 분명한 것은 AI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대응에 나섰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AI 활용에 관한 표준을 정했고, 유럽연합(EU)은 지난해 AI 기술 지원과 노동자 권리 보장을 포괄하는 ‘인공지능 법(AI Act)’을 제정했다. 일본은 2016년에 인간과 AI의 협력을 강화하는 규범(Society 5.0)을 마련했다.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는 AI로 위협받는 직업군에 재교육과 직업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AI가 노동시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는 끊임없이 나온다. 노동 법제와 관행이 낡은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난이 겹친 한국의 노동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더 힘겨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늦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노·사·정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 파상적 AI 공습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동의 위기의식에 따른 결정이었다. 당장 해답과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라도 논의·정리하자는 취지다.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5년 전 엔비디아의 두 배였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은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세계시장을 질주하던 한국의 철강·화학 공장들은 중국산의 공세로 하나둘씩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가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유로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외주화하는 경향이다.
결국 내부 노동시장은 조직률이 높고 교섭력이 강한 노조에 의해 보호막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 반면, 외부 노동시장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한국이 답습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일본 경제는 오히려 활기를 되찾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둔감했던 일본이 최근 개혁의 속도를 올린 것이 한몫했다. 노·사·정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2003년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대신 2006년 고령자 고용 의무화 조치를 단행했다. 2018년에는 70년 만의 노동 대개혁이라는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제정하고, 32개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 보상체계다. 신기술 연구개발(R&D) 업무는 초과 근무에 제한을 없앴다.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파격적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노사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 설득 덕분이었다.
한국의 노동법제와 관행은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 AI로 인해 노동시장이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전적으로 노·사·정 주체들의 생각과 의지에 달렸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한국노총이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노·사·정이 합의하고 선언했던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한 달이 넘도록 중단한 것은 유감이다.
계속 고용, 근로시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의제가 없다. 경사노위 참여 주체는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특히 노동계의 유일한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하루속히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IITP 리뷰 원]'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14/news-p.v1.20250114.1227401e239245dfa87e46893b062532_P1.jpg)
![[사설] 대한민국IT구루 출범에 부쳐](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2/news-a.v1.20250122.f7ec6c15ebfc47c49490a4775567b2f8_T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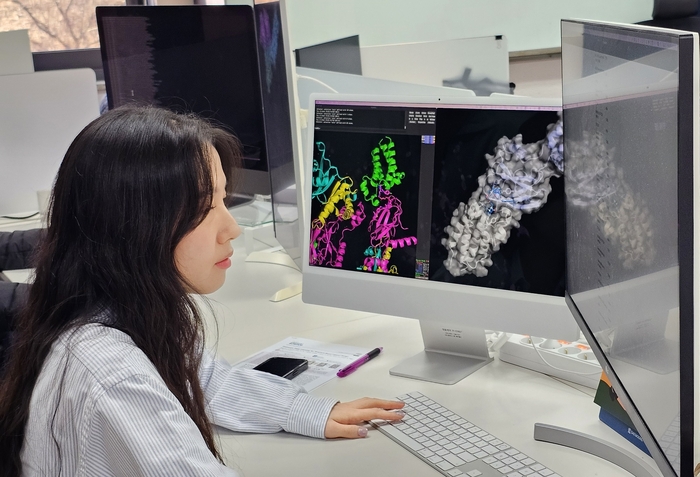



![[기고]양자 위협에 대비하자](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21/news-p.v1.20250121.b41e08964afe4463bb9ea891cfd209c7_P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