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6년 올림픽 전북 유치를 둘러싸고 정치권 논쟁 못지않게 졸속 추진 논란이 한창이다. 뜬금없다는 도민들 반응에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고 지난해 6월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전북도의 해명이다. 하지만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야 할 정치권마저 사전에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불통 행정' 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전략 노출을 우려해 보안 유지가 불가피 했다고 전제한 뒤 잼버리 후폭풍에 휘말려 발표 시기를 놓쳤다고 한다. 이유야 어찌됐든 향후 추진 동력을 감안하면 아쉬운 감이 크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올림픽 유치를 놓고 승산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여부다.
김관영 지사가 20일 도의회에서 소통 부족을 사과한 뒤 밝힌 유치 배경 중 하나가 개최지 문턱을 낮춘 IOC 권고였다. 영구시설 대신 기존시설과 임시시설 활용은 물론 복수의 국가 또는 도시의 공동개최 허용이 결정적이었다. 재정 부담이 적은 올림픽 개최를 추진한 것도, 먼저 유치에 나선 서울시와 공동 개최를 제안한 것도 여기에서 출발했다. 그렇다고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일 사안도 아닐 뿐더러 개인의 체육계 인맥에 좌우될 만큼 단순한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값진 경험을 쌓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쉽게 도전할 수 없는 지구촌 최대 축제로 고도의 전략과 함께 국가 차원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산 토끼 잡으려다 집 토끼 놓친다" 며 골든 타임의 전북 현안 해결에 집중할 때라고 조언한다. 지방 소멸 위기에서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홀대 속에서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새만금, 완주전주 통합 등 미래 동력의 가시적 성과가 더 절박하다는 것이다. 그런 기류에서 올림픽 유치는 꼭 거쳐야 하는 숙성 단계를 건너 뛰고 설익은 채로 결실을 맺으려는 인상을 받는다. 도 계획대로 광주·충남 등 경기장을 공동 사용한다고 해도 올림픽 시설 중 국제 공인 기준을 충족한 곳이 도내 몇 군데 인지 곱씹어 봐야 한다. 올림픽 경제 효과 42조원에 대해서도 주먹구구식 용역 결과라고 도의회가 문제 삼았다. 기존 개최국 13곳 중 10군데가 30조 정도 적자를 봤다며 올림픽을 '승자의 저주' 로 빗대기도 했다.
현재 유치 전망은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관건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내 개최지 선정이다. 인프라, 숙박 등은 대회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만, 코 앞에 닥친 서울시와 유치 경쟁은 현실적으로 녹록지가 않다. 국회 예산 확보 등 일 년 중 가장 중차대한 시기와 맞물려 집중력이 분산되는 데다 객관적 비교 우위도 밀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셈법이 복잡한 정치권의 응집력 있는 뒷받침과 함께 아직도 의아해 하는 도민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지가 핵심이다. 전북이 쏘아 올린 올림픽 유치의 꿈은 이 관문 통과가 첫 시험대다. 김영곤 논설위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김영곤 kyg@jjan.co.kr
다른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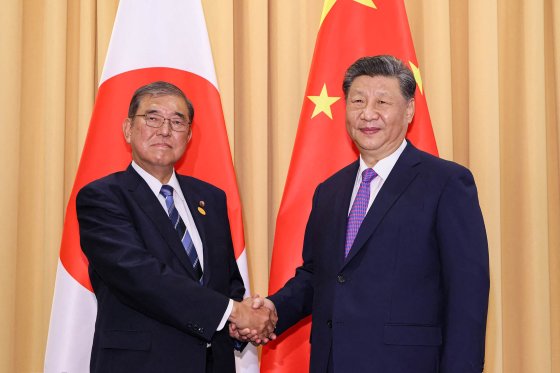



![[단독]신보 보증 확대 '감감무소식'···GTX B·C 착공 해 넘길 듯](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2/12/02/20221202000068_07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