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907년 종로에 이전에는 보지 못한 단체가 등장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연예계’라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연예단성사’가 설립된 것. ‘연예단성사’의 목적은 연예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공간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사회사업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주로 고아 등 불우이웃을 돕는 데에 쓰였다. 그 무대 공간이 바로 유명한 단성사였다. 우리는 단성사를 극장으로 기억하지만, 당시에는 연예인들의 공연장이었다. 이들 연예인은 당시 비하의 의미로 기생이라 불린 기녀들이다.
기녀들은 전통사회에서 신분이 낮았지만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예술 활동으로 먹고사는 데는 한계가 있어 ‘연예단성사’ 같은 곳이 필요했다. 실력이 출중해도 기녀라고 무시당하던 그들은 단성사에서 연극, 춤, 노래, 재담(개그), 연주 등 자신만의 예술 공연을 통해 많은 팬의 사랑을 받았다. 이들은 오늘날 배우, 가수, 안무가, 개그맨, 연주가다. 당시 기녀들은 기생조합을 결성해 활동했다. 예컨대 다동, 광교 기생조합와 같이 지역이나 무부기조합, 유부기조합처럼 결혼이나 남편 유무에 따라 조합을 만들었다. ‘연예단성사’는 이 조합들에서 예인 기녀들을 공수했다.

그러나 예술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조합의 전통은 사라졌다. 단성사가 상설영화관으로 변신하면서 영향력이 확장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연희 무대보다는 대중매체의 영향이 커져갔다. 라디오 방송에 이어 텔레비전 방송이 등장하면서 예인들은 더욱 위축됐다. 이러다 보니 영화사나 음반 제작사, 방송사의 힘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기생조합처럼 예인,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의 전통은 사라지게 되었다. 가수나 배우 협회가 있다 해도 유명무실해진 것은 대중미디어 기업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를 지나면서 대성기획 같은 음반사보다 기획소속사의 힘이 세졌다. 이제 기획소속사가 가수는 물론 음반·음원, 뮤직비디오까지 자체 레이블을 통해 제작했다. 결정적인 기폭제가 된 것이 SM엔터테인먼트다. 아이돌 음악 시장이 확장하고 산업화하면서 개별 가수들의 영향력은 축소되었는데, 특히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가수협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한류 현상의 급속한 진전은 방송 권력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으니 개별 멤버는 소속사의 로드맵을 따라야 편했다. 이런 상황에서 샤이니 종현도 언급했다시피 아이돌은 ‘컨베이어 벨트의 부속품처럼’ 수익을 위해 쓰이다가 교체되는 존재가 되어 갔다.
하지만 소속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했다. 피프티피프티나 뉴진스처럼 소속사의 부당한 대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모색을 하게 되면 배신이나 템퍼링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졌다. 개별 멤버가 소속사를 이탈해서 독립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성공한 사례도 없다.
흔히 가요계라면 대개 소속사,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관련 단체들이다. 가요계의 반응이나 움직임이라고 하면 이들의 반응을 말한다. 이런 단체들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연대하고 공조해 언론을 움직여왔다. 이에 대응해 아티스트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급급하다. 아이돌 멤버들은 부모가 유일한 지지 기반이다. 팬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외면하기 일쑤다. 더구나 아이돌 멤버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는 상황이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도 관련 단체가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다. 시민단체들도 이런 문제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화예술의 인권은 퇴행한 셈이다.
사실상 한국에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변하면서 활동을 모색하게 하는 최소한의 ‘연예단성사’ 같은 곳이 없다. 오로지 산업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을 대변하는 것이 우선일 뿐이다. 특히나 국가조차 문화산업의 수출을 강조하는 마당에 이런 흐름은 갈수록 더 심화된다. 최근 안무가들의 저작권 보호 요구가 나오자 관련 단체들은 경영과 산업 관점의 논리만 강조할 뿐 안무가들의 주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에 가까웠다.
선진국에서는 아티스트를 노동자로 보호한다. 한국은 이조차 안 된다. 불과 얼마 전 뉴진스 멤버들이 ‘노동자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조합 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떠올리는데, 자유시장 경제의 본산인 미국은 노동조합 문화가 굳건하다. 가수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한다. 이 노동조합을 통해 개인이 할 수 없는 권익을 보호하고 주장하며 이를 관철해낸다.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SAG-AFTRA(미국 배우 및 아티스트 노동조합)가 있다. 2024년 4월에도 그들의 활동이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들은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과 같은 주요 음반사에 최저임금 인상과 AI 사용의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최종 합의했다. 특히 가수의 목소리를 쉽게 복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합의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가수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복제할 경우 가수의 동의와 보상이 필요하며, 가수와 아티스트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가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러한 합의들이 중요한 것은 개별 아티스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문화예술을 국민을 넘어 세계인이 향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티스트의 인권과 권익을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단체가 등장해야 할 때다. 배우, 가수, 안무가, 아이돌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파편화되어 인권과 권익은 고사하고 생명까지 위협받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2025년에는 아티스트를 위한 통합적 단체가 출범하기를 기원한다.
필자 김헌식은 20대부터 문화 속에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특히 대중 문화 현상의 숲을 거닐거나 헤쳐왔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가 활약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한길을 가고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K컬처 리포트] 가상 아이돌 인기의 실체는?
· [K컬처 리포트] 제니와 장원영이 '불교'에 빠졌다?
· [K컬처 리포트] 현빈·박서준에게 '박수'를 보내는 까닭
· [K컬처 리포트] 로제 '아파트'가 차트 역주행하는 이유
· [K컬처 리포트] 백희나 그림책 '알사탕'을 일본서 애니메이션 만든 까닭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선데이] GS와 LG, 같은 공간 두 극장 이야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2/22/bad5db93-045a-4ea8-a7c0-84dda203ce5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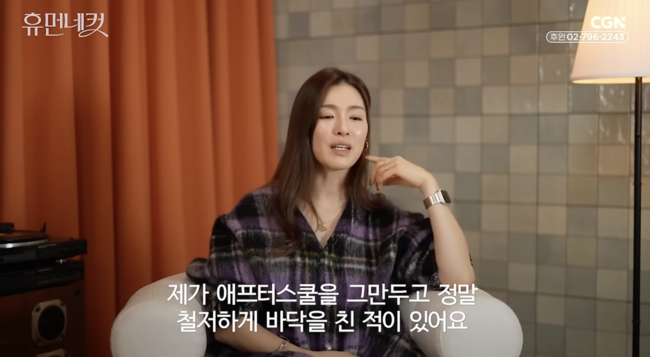

![[신경진의 민감(敏感) 중국어] ‘나타’인가 ‘너자’인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2/22/d517a152-7fc5-484a-aa17-d16ce58d4985.jpg)
![[영화계 단신] 브루탈리스트](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220/p1065624050040008_701_thum.jpg)
